매는 40살이면 로쇄하여 죽느냐 탈변하여 사느냐의 갈림길에 들어선다고 한다. 계속 살려면 높은 산정에 올라가서 부리를 바위에 쪼아 탈락시킨 후 다시 자라난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 다시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이 약 150일인데 모진 아픔과 굶음을 이겨내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 ‘매의 재생’ 이야기를 새삼스레 떠올리게 된 것은 조선어문 교사로서 탈락과 탈변의 선택이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조선어문이 지방 교재로 변하면서 나는 우리 초중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가?”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몇년간은 그나마 소학교 때 조선어문을 착실하게 배운 학생들이여서 과문을 랑독하고 외우고 모방글을 쓰고 과문극을 연기하고… 그러면서 원래 사용하던 조선어문 교과서의 과문을 일부 선택하여 통채로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입학한 6학년의 세개 반 학생들은 3분의 2가 조선어문 기초가 하나도 없는 원 청화소학교의 학생들인데다가 원 동력소학교 학생이라 하여도 기초가 별로였다.
“조선어문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선어문 지방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의 지시는 혼자서 초중 수업을 하면서 밤길을 걷는 듯한 나에게 고마운 등불이였다.
“ㅏㅑㅓㅕ”
“ㄱㄴㄷㄹ”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발음을 하나하나 따라 읽히면서 한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면 목이 아파서 더는 말하기가 싫어졌다. 그래도 다음번 수업에 나서면 열정이 나서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우리 말을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언어문자도 중요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노래와 음식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부지런히 찾았다. 그리하여 가족 이름을 배울 때는 “곰 세마리”, 수자를 배울 때는 “쥐가 백마리”, 생일 파티를 배울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등 노래를 결합하여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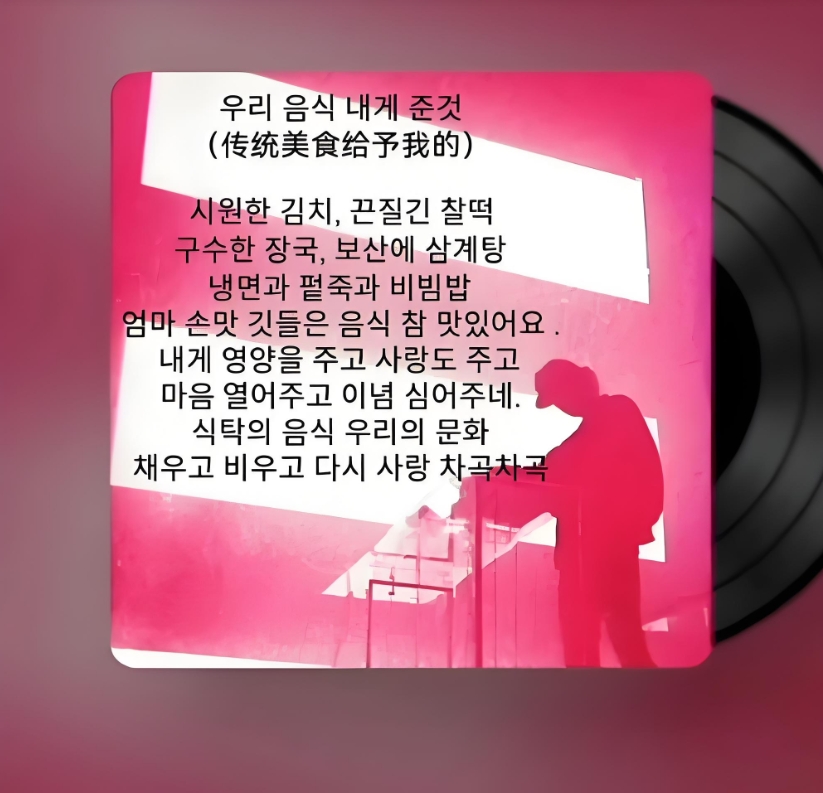
특히 민족 음식을 배울 때는 왕비가 2025년 음력설 야회에서 부른 노래 ‘세계가 나에게 준것’을 모방하여 ‘우리 음식 내게 준 것’으로 가사를 바꾸어 ‘전민 K가’로 록음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시원한 김치, 끈질긴 찰떡
구수한 장국, 영양에 삼계탕
랭면과 팥죽과 비빕밥
엄마 손맛 깃들은 음식
참 맛이 있어요
내게 영양을 주고 사랑도 주고
마음 열어주고 리념 심어주네
식탁의 음식 우리의 문화
채우고 비우고 다시 사랑 차곡차곡
이러노라니 나는 내심으로부터 민족 음식 문화에 대한 사랑과 우리 언어와 노래에 대한 애착이 짙게 우러났다. 그런데 선률이 너무 느리여 6학년 학생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노래와 미소(歌声与微笑)’에 맞추어 가사를 수개하였다.
(1절)
시원한 김치, 끈질긴 찰떡
달떡, 김밥 맛이 있어요
구수한 장국, 영양 삼계탕
랭면 비빕밥 맛이 있어요
(2절)
바삭한 치킨 냠냠 샤브샤브
잡채, 불고기 맛이 있어요
해독 미역국, 달콤한 감주
감자떡, 해물전 맛이 있어요.
(후렴)
엄마 손맛 깃들은 우리우리 음식
전통 민족음식
식탁 우의 음식 우리우리 문화
살아가는 지혜
이렇게 나는 자아도취에 빠져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으나 학생들의 학습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못했다.
“선생님, 조선어문을 시험칩니까?”
“조선어문을 배워서 무슨 소용있습니까?”
학생들의 목소리는 진실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열린시험을 조직하여 등급점수를 매기였으며 그가운데서 우수한 학생들의 시험지는 교학청사 1층의 현관에 전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어문을 배워서 한국에 류학한 우수한 졸업생들의 이야기, 중국 조선족 명인들의 이야기, 지구촌에 전해지고 있는 김치문화에 관한 이야기… 등을 동영상으로 학습하였다. 그리고 ‘효도’ 주제의 글짓기 공모 통지가 나오자 얼싸 좋다고 학생들의 글짓기 흥취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 며칠 후 조선어문 기초가 없는 한 학생이 응모글을 한편 썼다면서 가져왔다. 먼저 한어로 쓴 후 인터넷으로 번역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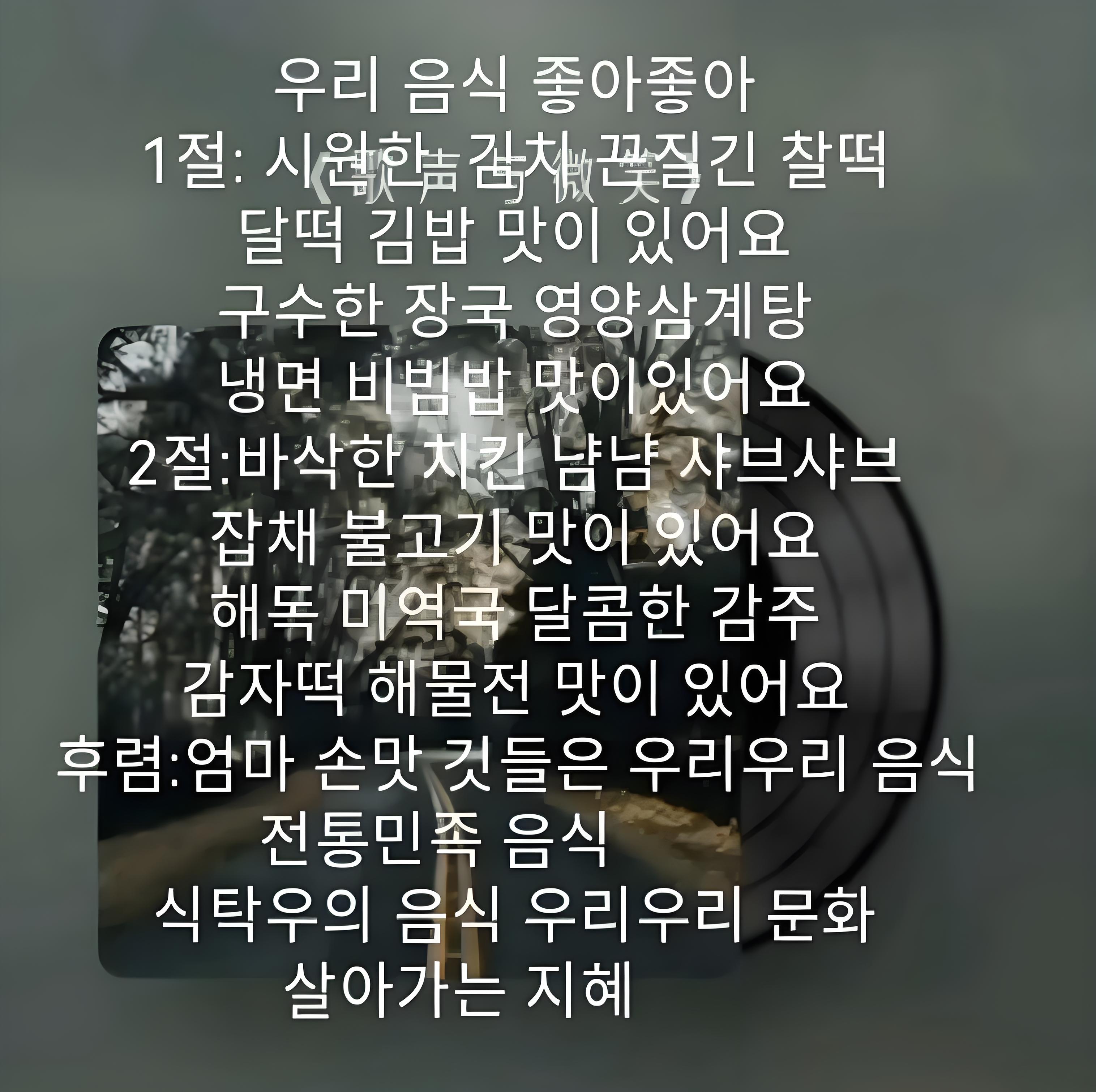
“참 잘 했어요. 글짓기 평의가 년말이니까 그동안 열실히 공부하여 자기가 쓴 문장을 조선말로 류창하게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조선어문을 열심히 학습하겠어요.”
이어서 번거롭지만 매 시간마다 조선어문 학습 상황을 평의하기 시작했다. 수업시간 내에 외우기(기초 없는 학생은 단어 외우기, 기초 있는 학생은 문장 외우기)를 완성하면 우수이고 규률을 지키고 학습태도가 좋으면 합격이며 규률과 학습태도가 나쁘면 불합격이다. 특히 과외시간에 사무실에 찾아와 외우기를 완성하면 우수인 동시에 ‘빵빵탕(막대사탕)’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조선어문 수업시간에 전체 학생의 평의결과를 환등으로 전시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숙제검사와 열린시험을 진행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의 시험지를 전교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6학년 학생들과 어울려 조선어문 학습을 두 학기 하고 보니 조선어문 교사로서의 새로운 성장을 많이 한 것 같다. 탈변의 돌파구를 찾아 거듭나기를 꾸준히 하느라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신념이 돋아나기도 한다. 정확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희망을 당겨올 수 있는 락관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나는 학생들과 조선어문 수업을 즐기고 있다.